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대안경제의 모색이 가능해졌다. 협동조합은 민간 조직임에도 공익성을 띄는 경우가 많아 정부나 자치단체와의 협조가 빈번하지만, 그 관계를 놓고는 우려와 기대가 함께 나오고 있다. CBS는 5차례에 걸친 ''협동조합, 민관 조합의 황금률을 찾다'' 연속 기사를 통해 양자간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협동조합''이 사라진 농업 협동조합
②사회적 협동조합, 민관의 손잡기
③''통제의 나라'' 속 협동조합 성장기
④"Want to do good? Do well!"
⑤민관 조합의 황금률, ''불가원불가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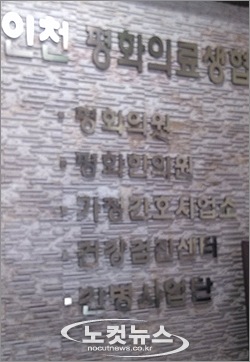 1
1
평일 이른 오전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평화의원을 찾았을 때 의료진과 환자들은 다른 여느 병원에서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의원은 물론 한의원, 치과, 건강검진센터까지 갖춘 이곳은 의료생활협동조합이다.
가입비 만원을 낸 조합원은 병원비를 일부 할인받고, 건강 관리를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을 병원, 내가 주인인 병원''이라는 자부심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어서, 1996년 창립 이후 조합원은 3천 3백 명을 넘어섰다.
조합원 52살 김종식 씨는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이사오자 주변의 추천으로 조합에 가입하게 됐다"면서 "독감 예방접종 등이 저렴하고 한방과 양방, 치과까지 함께 있어 편리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곳도 다수의 의료진을 갖춘 병원이어서 운영비 마련은 골칫거리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재택 환자들에 대한 방문 진료, 여기에 이러한 활동들을 가능하게 하는 협동조합 사무국 운영까지 감안하면 살림살이는 빠듯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평화의료생협은 지난 200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후 경영 컨설팅이 이뤄지고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일부를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기도 했다.
평화의료생협 이원숙 사무국장은 "협동조합 자체로는 민관의 파트너십이 부족하다"면서 "의료생협은 대부분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상당수는 의료뿐 아니라 먹거리·주택·노인복지 분야 등에서 공공성을 갖추고 있지만 민관 사이에는 이렇다 할 협력모델조차 없는 상태다.
자립과 자조를 강조하는 협동조합의 정신 때문이기도 하고 그동안 정부가 협동조합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까닭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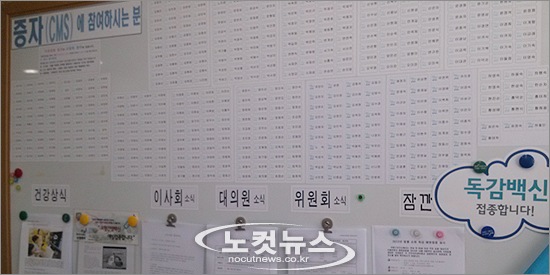 2
2
그러다가 사회의 공공성 확보가 어느 일방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관의 협력은 점차 강조돼 왔고, 그 맥락에서 최근 협동조합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12월 시행 예정인 협동조합기본법을 마련하면서 정부 지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은 이 때문이다.
협동조합 전문가인 한신대 장종익 교수는 "공공적 목적과 효율성을 혼자 달성하는 게 어려워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의 융복합 방식이 늘고 있고, 협동조합은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협동조합이라면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협동조합법은 그 지원 근거를 명시해 놓았다"고 말했다.
협동조합법은 특히 일반적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나누어 후자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갖춘 협동조합들은 섣불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BestNocut_R]
평화의료생협 이원숙 국장은 "가치를 살려나갈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아니라면 위험하다"면서 "의료생협 역시 정부와 반드시 파트너십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지원이 가능하느냐는, 현재의 협동조합과 새로 들어설 협동조합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떠올라 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취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