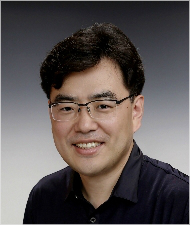 권경열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권경열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근래에 한평생 순탄하게 잘 살아온 이들이 은퇴한 뒤 다시 높은 공직에 도전하다가 청문회 등으로 인해 치부를 드러내거나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들의 인생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이었느냐는 차치하고, 더는 아쉬울 것이 없는 처지에서 굳이 그런 판단을 해서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것을 보면 의아하다 못해 안타깝기도 하다.
물론 나름대로 뜻한 바가 있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그 배경에는 결국 욕심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명예욕이든 물욕이든, 성취욕이든 지금보다 더 가지고자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제는 그런 욕심의 끝이 좋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고령이라는 것이 출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당연히 아니다. 원로로서의 경륜이나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단순히 이력서에, 회고록에 한 줄 더 채우기 위한 욕심에 앞 뒤 가리지 않고 나서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 이들은 공통적으로 '마지막 봉사'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다른 식으로도 국가와 사회, 이웃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옛날에는 만년을 깨끗하게 보내는 것을 높이 쳤다. 만절(晩節), 즉 만년의 절의를 온전히 보존했다는 표현은 한 인물의 평생을 규정하는 최고의 찬사 중의 하나였다. 노년에 명예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다면 노년에 절의를 잃는 것은 어떤 경우였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로 노년에도 벼슬에 연연하는가 아닌가가 그 판단의 기준이었다.
요즘은 60세를 전후로 정년이라는 제도가 일반화돼 있는데, 예전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다. 치사(致仕)라는 제도이다. 오늘날의 정년과 차이점은 강제성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물러난다는 것이다. 나이 70세가 되면 벼슬을 내어놓고 물러난다는 '예기(禮記)'의 구절에서 나온 이 말은 이후로 벼슬하는 사람들의 은퇴시기를 한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조선 선조 때 약포 정탁이 70세 즈음에 치사하는 상소를 올렸을 때다. 치사한 사례가 흔치 않았던 데다, 임란 때 충무공 이순신을 신구(伸救·죄가 없음을 밝히고 누명을 벗겨 구원함)하는 등, 국난을 극복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대신이었기에, 선조와 예조의 신하들이 여러 날에 걸쳐 논의를 했고, 그 결과 달마다 술과 고기를 보내주는 등의 극진한 예우를 해 주었다. 심지어 그를 잘 살펴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고을의 군수를 파직하기도 했다. 치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일화다.
국가적인 원로로서 우대받으며, 최고의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던 이가 그것을 내놓고 물러나기가 쉬웠겠는가? 그래서 치사한 사람에게는 국가에서도 특별히 예우를 갖춰 주었고, 본인도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은퇴하기 전의 관직명에다 치사라는 호칭을 추가해 부르기도 할 정도였다.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치사와 관련된 글을 3편이나 써서, 치사가 철저히 지켜져야 함을 주장했다. 70세 이전이라도 능력이 없거나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스스로 치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요즘 세상에서는 세력이 있는 자는 80, 90세가 돼도 벼슬에서 물러나지 않고, 소원하고 계급이 낮은 자는 외람스럽게 여겨 감히 물러가기를 청하지도 못하니, 무슨 경우냐고 신랄하게 비판하기까지 하고 있다. 또한 설령 70세가 넘은 사람이 건강하더라도 찾아보면 40, 50대에서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강태공도 80세 가까운 나이에 재상으로 등용돼 공을 세웠고, 고령임에도 훌륭한 치적을 남긴 다른 인물들의 사례도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얼핏 지나치게 격한 논의처럼 들린다. 그러나 성호의 글은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연령별 기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요지는 바로 염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주어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벼슬에서 물러날 지, 새로 벼슬에 나아갈 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벼슬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복숭아 두 개로 용사 셋을 죽였다는 이도살삼사(二桃殺三士)의 고사가 있다. 세 명에게 복숭아 두 개를 주면서 공이 있는 사람이 가지라고 했는데, 서로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복숭아를 다투다가 결국 부끄러움에 자결을 했다는 내용이다.
비록 교묘한 계략으로 상대를 제거한다는 고사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적어도 그들처럼 명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염치를 지닌 사람이 요즘 시대에 몇이나 있을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염치의 회복이 시대정신이 돼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