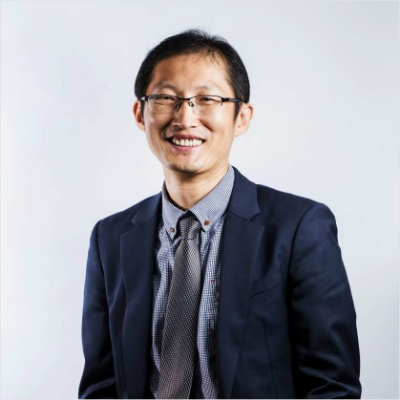 영화 '재심' 변호사 준영의 실제 인물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사진=박준영 변호사 제공)
영화 '재심' 변호사 준영의 실제 인물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사진=박준영 변호사 제공)
참으로 든든한 뒷심이다. 300만 관객을 향해 달려 가고 있는 이 영화는 개봉 한 달이 넘도록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머물러 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재심'의 이야기다.
때로는 허구보다 강한 '실화'가 있다. '재심'이 그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또한 그런 이야기다. '재심' 이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이 실화를 먼저 접한 대중도 있을 것이다.
택시 기사 살인범으로 10년 복역을 하고 세상에 나온 청년. 그러나 사실 청년은 범인이 아니었고, 자백 과정에는 경찰의 잔혹 행위가 있었다. 결국 청년은 망가진 삶을 바로잡기 위해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하게 된다.
그 중심에는 청년과 함께 재심을 결심한 박준영 변호사가 있었다. 그는 영화에서 배우 정우가 맡은 변호사 준영 역의 실제 인물이다.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이다 보니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됐죠. 개봉 당시에 국내 정치, 사회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고 예측불가능해서 잘 버틸 수 있을지…. 그런데 그런 걱정이 필요없게 됐네요."
원래 박준영 변호사는 '공법'(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쪽이 아닌 '헌법'과 '행정법'에 관심이 많았단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련 법 강의를 나간적도 있다고. 처음부터 그가 약자들을 돕거나 사회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다. 다만 '재심' 사건을 계속 만나다보니, 점점 그런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상황에 따라 관심사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공법 쪽으로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수원노숙소녀 재심 사건을 맡다 보니 공부를 했고, 성과를 내다보니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는 억울한 일 당한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세요."
영화 '재심'을 연출한 김태윤 감독과는 몇 번 만나서 술잔을 나누다보니 형동생하는 사이가 됐다. 다소 부담스러울 법한데도 영화 속 캐릭터가 실명인 것에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김 감독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뿐이었다.
"그냥 이 사건을 영화화한다는 것 만으로 너무 고마웠죠. 제가 변호인인데 나쁘게 그려지겠어요. 그런 전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제 캐릭터에 욕심을 부리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죠. 뭔가 더 멋있게 나오고 싶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실명 캐릭터 때문에 영화를 볼 때마다 뜨거워지는 낯은 박 변호사의 몫이다. 영화와 실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에게 물어봤다.
"여관에서의 폭행 같은 부분은 현실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죠. 대부분 가혹 행위가 몸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합니다.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방법도 있죠. 당사자인 최 군은 영화보다 더 당했으면 당했지, 덜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잔인한 폭행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피해자인 최 군과 박 변호사는 경찰의 '유감 표명'을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과' 전에 정확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과는 기본적으로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책임자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책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진솔하게 담겨 있어야 하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재심'은 진검승부를 펼쳐야 한다. 한 사건에 대해 다시 동일한 사유로 '재심'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만큼 기존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와 검증이 요구된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 모든 것들을 뒤집는 일이기에 직면하는 어려움들도 많다.
"방해도 많고, 의심가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죠. 국가 시스템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못을 한 주체가 국가면,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국가여야 하지 않나.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답답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