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지난해 11월 27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 항우연 제공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지난해 11월 27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 항우연 제공미국 스페이스X의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도 민간 우주기업 육성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역시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발사체 기술 기반을 확보했고, 위성 제작과 통신 장비, 정밀 부품 등 연관 산업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와 동일한 형태의 기업이 한국에서 단기간에 재현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과 달리 국내 우주 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데다, 발사 수요와 투자 회수 구조, 실패를 감내하는 산업 환경이 크게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는 기술력의 한계라기보다 시장 규모와 수요 구조, 리스크 분담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와 환경이 정비될 경우 한국형 민간 우주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美, 확실한 초기 수요가 민간기업 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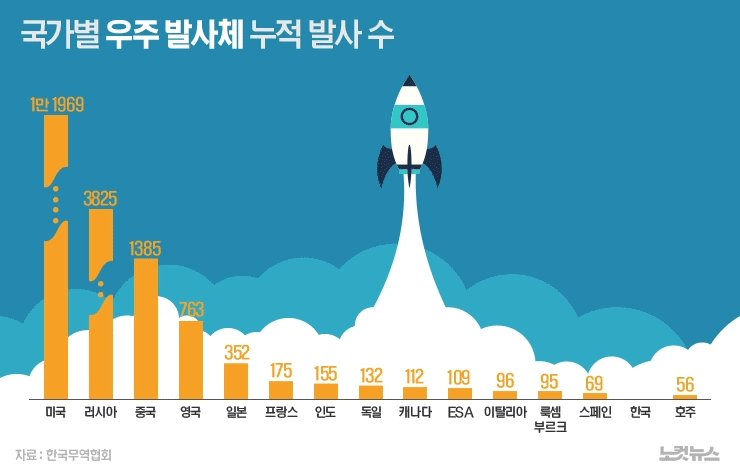
18일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 시점이 오는 6월로 거론되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민간 우주기업의 대표 사례로 성장했는지를 다시 짚어보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가 성장할 수 있었던 조건으로 미 항공우주청(NASA)과 미 국방부처럼 발사 서비스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초기 수요처의 존재를 가장 먼저 꼽는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민간기업이 설계·일정·시험을 주도하는 방식이 자리 잡았다. 기업은 발사를 반복하며 실패와 성공 데이터를 동시에 축적하고, 이를 설계 개선과 공정 표준화로 연결해 발사 단가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다.
스페이스X는 2024년 팔콘 계열 로켓으로 134회의 발사를 수행했다. 이는 같은 해 미국에서 이뤄진 발사 횟수의 약 87%, 전 세계 발사 횟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이처럼 민간 주도의 재사용 로켓 기술을 활용한 빠른 발사 빈도는 지난해 기준 연간 165회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역량 축적 중…"발사 경험 누적 필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4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가 발사대에 거치된 모습.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에서 관측되고 있다. 최원철 기자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4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가 발사대에 거치된 모습.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에서 관측되고 있다. 최원철 기자한국 역시 발사체 엔진과 체계 기술을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확보했고, 위성체 제작과 지상 장비·부품 분야에서도 민간 기업들의 역량이 축적돼 있다.
위성 분야에서는 쎄트렉아이, 한화시스템, 인텔리안테크 등 다양한 기업이 역할을 확장해왔고, 발사체·제작·지상 설비 영역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라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두산에너빌리티 등 다수 기업이 참여해왔다.
다만 '한국판 스페이스X' 논의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지점은 참여 기업의 숫자보다, 민간기업이 설계·운영 전반을 통합적으로 주도하며 반복 발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구조를 얼마나 빠르게 만들 수 있느냐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도 발사체와 위성, 부품 등 개별 기술 역량은 상당 부분 축적돼 있다"면서도 "문제는 발사 수요가 제한적이고 발사 주기가 길어 민간이 반복 발사를 통해 경험과 데이터를 빠르게 쌓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빈번한 발사와 운영 경험이 누적되는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5호기 발사를 2026년 3분기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달 8일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오는 8월 발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누리호 4호기 발사 이후 9개월 만에 5호기 발사에 나서는 셈이다.
누리호는 2021년 1차 시험 발사를 통해 핵심 기술을 검증했고, 2·3·4차 발사에서 연속으로 궤도 투입에 성공했다. 5차 발사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기술·운영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사판은 어렵지만, 한국형 모델은 가능"

우리나라 발사체 분야도 미국처럼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 전환이 예상된다. 다만 대규모 자본과 긴 개발 주기, 높은 실패 위험을 수반하는 분야인 만큼, 국내에서는 당분간 정부 주도의 장기적 투자가 우주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스페이스X의 '복사판'보다 한국 여건에 맞는 경로가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발사체 단일 분야에서 곧장 글로벌 선두를 추격하기보다는, 소형 위성 수요 확대와 위성 데이터·AI 분석, 군·재난·기후 관측 등 서비스 시장에서 우선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큐브위성 'K-RadCube'가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돼 우주로 향하게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주항공청장 관계자는 "K-RadCube는 한국의 심우주 큐브위성 개발·운영 역량과 유인 우주탐사 임무에 적용 가능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검증하는 중요한 사례"라며 "향후 달과 심우주 탐사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한국에서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은 기술력의 유무보다 시장과 제도의 설계가 반복 발사와 상업화를 얼마나 촉진할 수 있느냐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저궤도위성통신산업협의회 출범식. 연합뉴스
저궤도위성통신산업협의회 출범식. 연합뉴스전문가들은 한국 우주산업이 단기간에 민간 주도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창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 발사체 분야는 위성보다 훨씬 많은 자본과 긴 개발 기간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국내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장기간 투자를 감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방위산업의 성장 과정을 참고 사례로 들었다. 기 교수는 "과거 방산 분야 역시 처음에는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던 단계였지만, 정부와 군이 오랜 기간 꾸준히 투자하고 사용해 주면서 기술을 축적했고, 그 결과 수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우주항공 분야도 비슷하게 단기간 성과보다는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우주 산업은 정권 임기 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민간 주도 전환 논의와 별개로 정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수요 창출이 병행돼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방산 사례처럼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우주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