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당무 거부’ 한나절 만에 꼬리를 내렸다.
안보관이 누구보다 투철하다는 김 대표가 국군의 날 기념식에 불참하고 고향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가지 않을 정도의 결기를 보이는듯 하더니 언제 그랬냐는듯 고개를 숙인 것이다.
청와대를 상대로 대거리를 제대로 벌일 것으로 관측됐으나, 결국 맞짱 한번 뜨지 못하고 물러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가 하루 만에 사과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5월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파동까지 거론하면 세 번째이지만 본인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으로 빚은 청와대와의 갈등은 두 차례다.
지난해 7월 14일 전당대회 당시 “청와대에 할 말을 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는 다짐과 경선 구호는 온데간데없이 ‘할 말을 못하는’ 당 대표가 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청와대 제공)
왜 박근혜 대통령 앞에만 서면 왜소해지는 것일까.
첫째, 김 대표는 대통령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야당 대표가 아닌 집권 여당의 대표다. 여당 대표가 사사건건 대통령에 맞섰다간 권력투쟁을 벌인다는 비판의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다. 당 지지자들과 내부로부터 심한 견제는 대통령이 아닌 당 대표에게로 돌아온다.
물론 예외는 있다.
지난 1990년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을 상대로 칩거라는 협박 정치를 하기도 했고, 지난 2010년 박근혜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야심작인 세종시 수정 문제로 충돌을 해 승리했다. 물론 차기 권력을 거머쥐었다.
둘째,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지지 기반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박 대통령은 현재 50%안팎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반해 대선 주자로서의 김 대표 지지율은 10%대 중반이다. 김 대표가 박 대통령을 뛰어넘기에는 지역적 지지 기반이나 지지층이 빈약하다. 따라서 김 대표가 당 대표와 차기 권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박 대통령에 대들 수 없다.
셋째, 김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 확보를 박 대통령의 지지세에 기대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자들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새누리당의 후보도, 대선 고지도 점령할 수 없다는 나름의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할 때는 지지율이 오르지만 박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이면 바로 지지세가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바로 이런 한계를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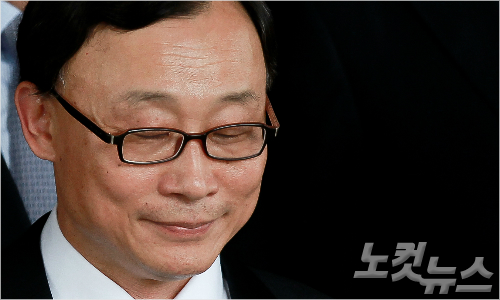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진=자료사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진=자료사진)
넷째, 새누리당 의원들은 생리상 권력자의 눈에 벗어나 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이 아니다. 심지어는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똑똑히 지켜본 '학습 효과'도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혼외 아들 문제로 내치는가 하면 자신의 정치를 한다며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퇴진시킨 것을 목도해서다.
“대통령과 맞서선 이길 수 없다”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대통령의 권한과 청와대의 힘을 겪었기에 나온 경험담이다. 김 대표는 “이회창 전 후보가 지난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 맞서다 정권을 김대중에게 뺏긴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다섯째, 김 대표는 정치적 역량 측면에서 볼 때 박 대통령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김 대표가 ‘정치 5단’이라면 박 대통령은 '정치 9단'이라는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완구 전 총리는 국무총리에 발탁되기 전 “박근혜 대통령은 3김씨를 뛰어넘는 정치 10단쯤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역 정치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박 대통령의 정치 급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력과 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부딪쳤다간 판판이 깨진다. 야당이 박 대통령과 맞서면 맞설수록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뒤로 쳐지는 이유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은 선거 지형을 ‘박근혜 심판론’이 먹히지 않게 만들어버릴 줄 아는 정치인이라고 해야 한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대전은요?" 한마디가 불러온 2006년 지방선거 판세가 대표적이다. 김 대표 뿐 아니라 야당 역시 박 대통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선거에 이기기 쉽지 않다.
여섯째, 김 대표는 개인적으로 박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단계를 넘어 일종의 사랑(정치인으로서의 평가)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이다. 때론 정서적인 접근을 하는 김 대표가 언제나 냉정한 박 대통령에게 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성과 감정의 대립 결과는 뻔하다.
일곱째, 6개월 앞둔 총선 승리가 날아간다는 부담이 김 대표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했다고 한다. 김 대표가 박 대통령과 싸울 경우 유리한 선거 판세가 확 바뀌어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김 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여권 분열은 공멸이라는 인식이다.
김 대표는 “이런 판세로 내년 4월을 맞으면 새누리당이 압승할 수 있다고 보지만 만약 더 싸우다간 청와대도, 당도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러났다는 핀잔을 들을지언정 총선을 망칠 수야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지극히 김무성다운 발상이자 발을 빼는 방식이다.
위에 열거한 이런저런 이유 외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을 비롯한 여러 까닭들이 복합 작용한다. 김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타고 넘기에는, 결전을 치르기에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전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