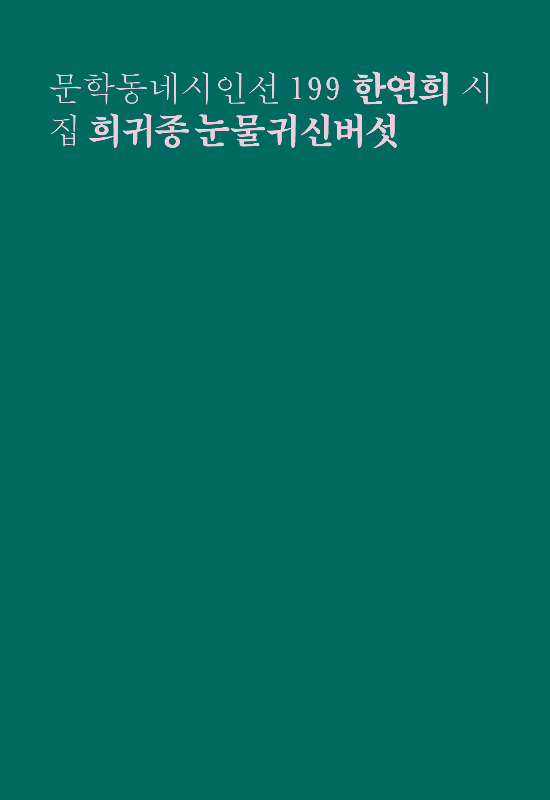 문학동네 제공
문학동네 제공 2016년 창비신인문학상을 통해 '일상의 친근한 사물과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등단한 한연희 시인의 두번 째 시집 '희귀종 눈물귀신버섯'이 출간됐다.
첫 번째 시집 '폭설이었다 그다음은'(아침달·2020)에서 매 순간 우리를 틀에 가두고 교정하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아름다운 화자를 앞세워 끊임없는 폭설이 쏟아지는 종말론적 세계 속에서 절망 대신 사랑의 힘으로 헤쳐나갈 것을 다짐했던 시인.
이번 시집에서는 좀더 어둡고 축축한 곳, 빛이 들지 않아 외면받기 쉬운 곳으로 눈길을 돌려 그것에 자리하고 있는 기묘한 존재들을 들여다본다.
"여전히 아이들은 이른 죽음을 맞이하고 / 가볍고 작고 흰 손가락이 그렇게 무참히 얼어붙고 있는데 / 그러니 12월에는 / 뜨거운 통 안에서 퍼올린 이름들을 불러줘야 해 / 이 끈질긴 애정으로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 무슨 이야기든 듣고 말해야 한다" - '12월'에서
저 혼자 자라나고, 귀신처럼 들러붙는, 이상한 유기체들은 때로는 기계 속 유령, 계곡 속 원혼, 잿물과 산비둘기의 피로 이루어진 비누로 몸을 바꿔가며 오싹하면서도 독특한 목소리로 이들의 서글픈 이야기를 꺼내 놓는다.
작가는 이번 시집에 대해 "축축하거나 들끓는 감정으로 메꾼 이 시집이 저 혼자 자라나 제게서 떨어져버린 이상한 유기체와 같다"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비집고 나오는 웃음을, 한(恨)의 정서를 녹여내려 했다"고 말한다.
시집에는 유령뿐만 아니라 다양한 존재들, 귀신이나 공포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한다.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귀신들은 무섭지만 그저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고 싶어할 뿐이라는 작가는 그런 억눌린 마음들에 귀를 기울이고 싶었다며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