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이거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꽃미남 간첩'이거나. 탈북민(북한이탈주민)들이 최근 영화와 방송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 이미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2만 5천명의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탈북민들의 '진짜 모습'은 박제된 이미지 속에 현실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 사이 탈북민 집단 내부에서는 기득권 집단이 탈북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을 착취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기득권이 돼버린 소수는 누구이고, 이런 상황은 어떤 잘못된 접근에서 비롯됐을까.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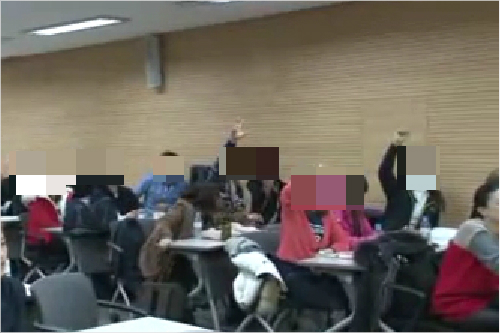 예비 대학생 캠프에 참여한 탈북청년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유튜브 영상 캡처)
예비 대학생 캠프에 참여한 탈북청년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유튜브 영상 캡처)
"탈북민이라고 밝히면, 북한에서 얼마나 굶었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언론에서 꽃제비 얘기만 나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측은한 표정을 지으며 그런 질문을 할 때 굉장히 난감하고 싫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20대 탈북 여성은 '불쌍한 사람들'로만 비치는 탈북민 이미지가 제일 힘들다고 말한다. 이런 편견이 되레 자신이 이룬 성과마저 '혜택의 결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아서, 될 수 있으면 탈북민 출신이라는 것을 숨길 때가 많다고 한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몇 가지 성격으로 단순화하기엔 탈북민 규모가 상당해졌는데도, 사회적 분위기는 '불쌍한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그동안의 시각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획일적 시선이 탈북자들의 적응을 돕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배제하고 목소리만 큰 소수 탈북민만 대변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젊은 탈북민들 중에는 이런 분위기가 싫어서 아예 탈북민 커뮤니티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탈북민들은 일부 1세대 탈북민들의 행태에 대해 "정착지원금과 취업장려금은 물론이고 각종 교육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지 않냐"며 "소수 사람들 때문에 탈북민들이 공짜로 달라고 생떼쓰는 집단으로 비치는 게 불쾌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20대 탈북민은 "'불쌍하니까 달라는 대로 준다' 는 식이면 정정당당히 경쟁해서 남한 사회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탈북민 출신인 현인애 박사(북한학)는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100% 부정하기는 어렵고, 이들을 지지하는 탈북민들도 상당수 있다"면서도 "다만 활동하는 단체들이 대표성이 있는가,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한 면이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박사는 "시민운동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소양과 경제적 여건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것인데, 탈북민들의 일반적 상황에서 이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며 "결국 세대갈등은 탈북민들이 민주주의 사회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비용이자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